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여정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 이어, 지난 8월 마무리된 추가 협상(INC-5.2)마저 구체적인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플라스틱 국제협약(INC)은 기약 없는 표류를 시작했다.
인류 최악의 환경 재앙이 된 플라스틱의 운명을 결정할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국제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여전히 '플라스틱 생산량 자체의 감축 의무화' 여부다. 이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을 포함해 120여 개국이 속한 '우호국 연합(HAC)'은 생산량 감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재활용 기술만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문제의 근원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단계부터 강력히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과 글로벌 석유화학 업계의 반발은 완강하다. 이들은 생산 감축이 자국 경제와 산업에 미칠 막대한 타격을 우려하며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대신 이들은 재활용 기술 고도화, 폐기물 관리 시스템 개선 등 '재활용 확대'와 '순환 경제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세계 최대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국인 미국과 중국 역시 산업계의 입장을 고려해 생산 감축 의무화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가 협상 과정에서도 일부 국가들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협상 진행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사용해 환경 단체들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또한 석유화학 업계의 강력한 로비가 협상 실패의 배후에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제협약의 표류는 국내 산업계에도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당장의 강력한 규제는 피했지만, 장기적으로 순환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글로벌 스탠더드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재생 원료 시장을 선점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재활용 기술에 대한 R&D 투자 확대, 재사용 및 재활용이 용이한 에코 디자인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국제 사회의 약속이 언제쯤 지구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우려 속에서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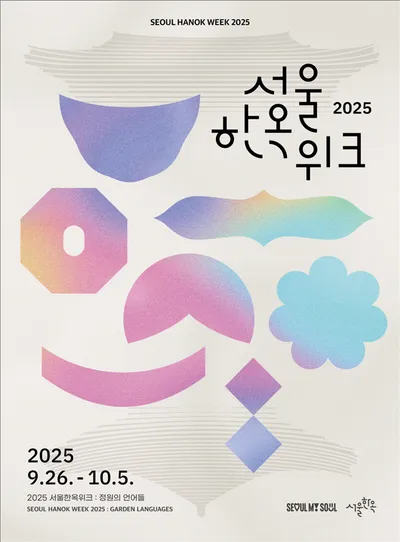
![[집중기획] 2026년 세계 산불 달력, 그을린 미래를 직시하다](https://cdn.breathjournal.com/w400/q80/article-images/2025-10-01/5be639f5-d684-4605-acb1-e0127c554e7c.png)





댓글 (0)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