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8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INC-5.2)은 끝내 최종 문안을 채택하지 못했다. 결렬이라는 결과는 실망스럽지만, 동시에 “판을 새로 짜라”는 신호로도 읽힌다.
협약이 멈춰 있어도 도시의 조달 기준과 기업의 구매 지침이 먼저 규범을 만들어 간다. 한국은 ‘신재(처음 생산된) 플라스틱의 절대 감축’, ‘재사용 표준’, ‘유해 첨가제 정보 공개’라는 세 축에서 느리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합의를 준비해야 한다.
제네바에서 확인한 한계는 문장 다듬기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경계였다. 다수 국가는 생산 감축과 유해 첨가제 규제를 분명히 요구했지만, 일부 산유국과 생산국은 만장일치 원칙을 방패 삼아 그 요구를 끝내 문턱 밖에 세워두었다.
그래서 이번 결렬은 아쉬움이면서도 한 가지 사실을 드러낸다. 서둘러 타결되는 협약일수록 내용은 얇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협상이 더디다고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조급한 절충은 아니다.
판을 새로 설계하는 일이다. 절차도 쟁점별 표결과 단계적 채택 같은 유연성을 품어야 한다.협상장 밖에서는 이미 작동 중인 기준과 표준이 동심원처럼 퍼지며 협상을 끌어당겨야 한다.
법조문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은 도시의 조달 기준, 기업의 구매 지침, 시민이 체감하는 운영 절차다. 앞으로 1~2년을 보면, 하나의 거대한 조약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는 어렵다.
여러 궤도의 변화가 서로를 자극하며 규범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법적 구속력이 약하더라도 뜻있는 연대는 지침을 먼저 제시할 것이고, 유럽을 중심으로 한 지역·국가 규정은 수출과 조달의 문턱을 통해 사실상의 의무로 작동할 것이다.
글로벌 기업과 유통 업체는 불확실성의 비용을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기준을 맞추기 시작했다. 신재 플라스틱의 절대 감축, 재사용 체계의 회전 속도, 첨가제 공개 같은 조건이 구매 요구사항으로 들어가면 협상의 문구가 미정이어도 공급망은 이미 새 질서에 적응한다.
협약이 멈춰 있어도 규범은 이렇게 전진한다. 변화의 무대는 협상장보다 도시와 시장에 가깝다. 왜 도시는 계속 ‘실험실’이어야 할까.
빠른 합의를 바라는 마음은 정당하지만, 약한 합의가 만들어내는 잠금 효과는 더 길다. 도시는 이 위험을 피해가면서도 합의를 앞당기는 통로가 된다.
법을 고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조달과 행사 운영 기준은 계절이 바뀌기 전에 바꿀 수 있다. 축제의 컵이 재사용으로 바뀌고, 공공급식의 용기가 다회용으로 전환되는 순간부터 자료가 쌓인다.
회수율, 세척 비용, 위생 지표, 만족도 같은 숫자가 곧 정책 설계의 언어가 된다. 국제 무대가 멈췄을 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증거다. 대도시의 조달 기준은 곧바로 시장을 설득하고, 납품사는 포장과 첨가제, 재사용 물류를 기준에 맞추도록 설계를 바꾸며 사실상의 ‘사전 합의’를 만든다.
무엇보다 도시의 강점은 실패를 감당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작은 실패를 허용하는 곳에서만 큰 전환의 설계도가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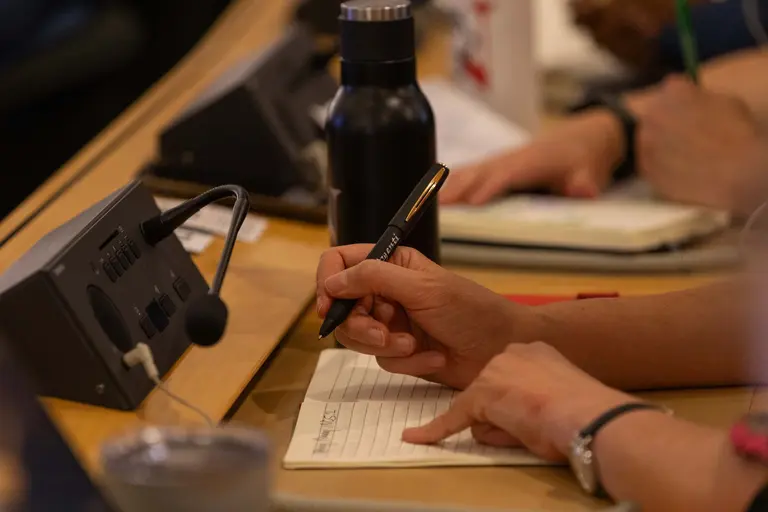
이런 축적이 있어야 빠르면서도 얕지 않은 합의가 가능해진다. 현장의 자료가 협상의 문구를 이끄는 장면은 여기서 시작된다.이제 한국의 선택을 말하자.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운영과 숫자의 신뢰다.
기업의 지속가능 보고는 재활용률 중심의 안도감을 벗어나, 신재 플라스틱의 ‘절대 감축’을 정면에 놓아야 한다. 연간 총량 몇 퍼센트가 아니라, 분기별·제품군별로 쪼개 공개하는 방식이 실제 감축을 증명한다.
공급망의 1차·2차 협력사와 공동 목표를 세워 ‘범위 3(공급망 간접배출)’을 현실로 만드는 일도 더 미룰 수 없다. 재사용은 원칙이 아니라 ‘표준’이 되어야 한다.
보증금, 세척, 회수, 품질 검사, 위생 점검을 하나의 운영 절차로 묶어 국가 표준으로 제정하고, 지자체 조달과 대형 행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면 투자와 확대가 뒤따른다. 유해성 정보 공개 역시 시급하다.
어떤 첨가제가 들어갔는지, 어떤 위험군을 언제까지 퇴출할지,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어떻게 공개할지, 일정을 갖춘 이행 계획으로 제시해야 한다.
유럽과 국제 지침과도 서로 인정될 수 있는 틀을 미리 설계하면, 규정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적응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운영과 숫자를 정렬하는 과정이 한국의 신뢰를 만든다. 그 신뢰가 다음 협상의 바탕이 된다.
정치가 멈춘 자리에서 ‘기준’이 정치를 이끈다. 도시의 조달 기준, 기업의 구매 기준, 시민이 체감하는 운영 절차가 먼저 사실상의 합의를 만들고, 그 합의가 뒤늦게 국제 문장에 새겨진다.
“합의가 있어야 행동한다”는 습관을 내려놓고, 생산을 실제로 줄이고, 재사용을 실제로 운영하며, 유해성을 실제로 드러내자. 그렇게 축적된 숫자와 표준, 관행의 두께가 느린 합의를 ‘약한 합의’로 만들지 않고, 늦었지만 제대로 된 합의로 바꿔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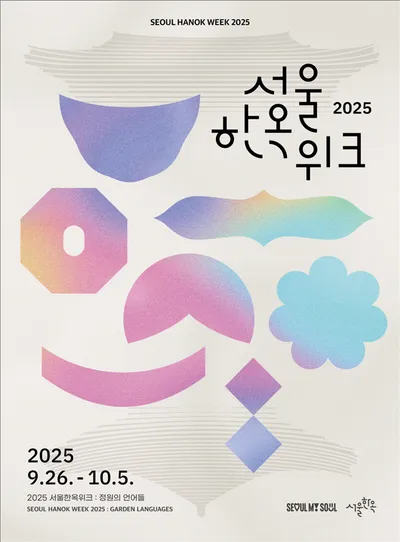
![[집중기획] 2026년 세계 산불 달력, 그을린 미래를 직시하다](https://cdn.breathjournal.com/w400/q80/article-images/2025-10-01/5be639f5-d684-4605-acb1-e0127c554e7c.png)





댓글 (0)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