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지난 3년간 영화제는 팬데믹의 여파, 내부 갈등, 예산 삭감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관객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화제 본연의 가치를 재정립하며, 다시 도약을 준비해왔다. 2025년의 BIFF는 단순한 부활 선언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 해다.
2022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정상 개최가 이뤄진 해였다. 초청작 확대와 다양한 섹션 운영으로 위축된 분위기를 되살렸고, 위기 극복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3년은 가장 힘겨운 시기였다. 예산 삭감과 내부 갈등, 영화인들의 보이콧 선언이 이어지면서 초청작 수와 상영관 규모가 크게 줄었고, 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마저 도마에 올랐다.
전환점은 2024년에 찾아왔다. 초청작 수는 줄었지만 좌석 점유율이 84%에 달하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OTT 개막작 선정, 관객 투표상 신설, 샤넬과 함께 제정한 ‘까멜리아상’ 등 새로운 시도가 관객 친화적 변화를 이끌었다. 여성 영화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역시 영화제의 가치를 확장했다. 규모 축소 대신 내실을 강화하며, BIFF는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했다.
그리고 30주년을 맞은 2025년, 영화제는 다시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초청작 241편을 포함해 총 328편이 상영되고, 경쟁 부문이 신설되어 BIFF만의 권위 있는 상을 구축하려는 첫발을 뗐다. 아시아 영화 100선 회고전, 공동체 프로그램 확대, AI 체험 라운지 운영 등은 전통과 현대, 관객과 기술이 교차하는 실험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3년은 위기와 붕괴, 회복의 과정을 거친 시간이었다. 올해 영화제가 강조하는 것은 ‘완전한 부활’보다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다. 국제 영화제의 위상은 여전히 칸·베니스·베를린과 차이가 크지만, 아시아 영화의 중심이라는 BIFF의 정체성은 흔들림이 없다. 무엇보다 관객과의 관계 회복은 가장 큰 성과로, 향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든든한 토대가 되고 있다.
과제와 기대
부산국제영화제는 다시 발걸음을 뗐다. 그러나 30주년은 과거의 영광을 회복했다고 선언하는 자리가 아니다. 관객 중심의 내실 강화, 경쟁 부문 신설, 국제 협력 확대는 모두 재도약을 위한 과정이다. 향후 과제는 이 회복의 흐름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결국 관객과의 신뢰, 아시아 영화 교류 허브,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영화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BIFF의 다음 10년을 결정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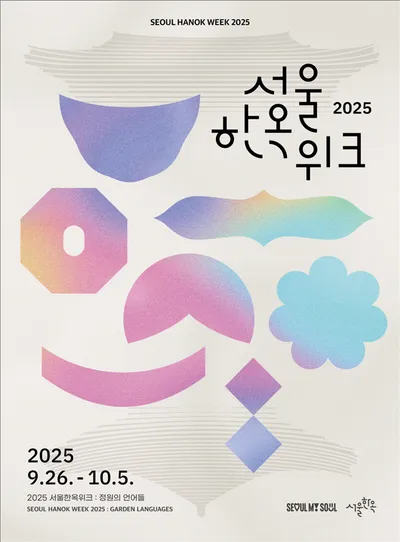
![[집중기획] 2026년 세계 산불 달력, 그을린 미래를 직시하다](https://cdn.breathjournal.com/w400/q80/article-images/2025-10-01/5be639f5-d684-4605-acb1-e0127c554e7c.png)


![[BIFF 2025 기획] 환경과 전통, 스크린이 던지는 네 편의 이야기](https://cdn.breathjournal.com/w1920/q75/article-images/2025-09-16/a3a89a51-9c4b-46f6-a01e-0dc19bac72a5.png)

댓글 (0)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