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팬데믹은 인간 정신과 공동체를 동시에 시험한 거대한 충격이었다. 불안, 고립, 경제적 불안정은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뒤흔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리적 웰빙 지표는 회복 곡선을 그렸다. '네이처 에이징(Nature Aging)'에 실린 연구는 팬데믹 이후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점차 회복되었고, 일부 영역에서는 오히려 팬데믹 이전보다 긍정적인 지표가 관찰되었다고 보고했다. 또 '플로스 원(PLOS ONE)'에서 발표된 한국 성인 대상 연구는 팬데믹 전·중·후 시기를 비교했을 때 우울·불안이 감소하고, 건강행태가 일부 개선되는 양상이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지닌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실증적 근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회복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 한국 사회는 급속히 1인 가구 사회로 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1인 가구 수는 약 1,000만 가구, 전체 가구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1인 가구 비율은 15% 남짓이었지만, 이제는 가장 흔한 가구 형태가 되었다. 특히 20~3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연구에 따르면 청년층은 주거·직업 이동성이 주요 원인이고, 노년층은 배우자 상실과 고립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사회적 지지망이 약화되는 가운데, 회복이 쉽게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이다. 팬데믹 이후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고 하더라도, 혼자 살아가는 구조가 심화되면 고립과 외로움은 다시 커질 수 있다. 국내외 여러 연구는 혼자 사는 성인일수록 우울감과 불안감 비율이 높고, 사회적 고립이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회복은 개인의 내면적 힘에서 출발하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확장시키는 것은 사회적 연결과 제도적 장치다.
한국 드라마 속에는 여전히 대가족이 등장하고 가족애가 주요한 이야기 축을 이룬다. 그러나 실제 한국 사회의 방향은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문화적 서사와 현실의 괴리 속에서, 사람들은 때로 더 큰 고립감을 느낄 수 있다. 팬데믹이 남긴 교훈이 “인간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선다”는 희망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과제는 그 희망을 지탱할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팬데믹 이후의 회복은 인간이 가진 힘과 용기를 증명했다. 하지만 앞으로의 사회가 더 깊은 고립으로 흐른다면, 그 회복은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 회복력은 인간 안에 있지만, 그것을 지속시키는 조건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 사회가 선택하는 방향이 결국 개인의 회복력마저 결정할 것이다.
참고
- “Recovery of psychological wellbeing following the COVID-19 pandemic” (Nature Aging, 2025)
- “Health behavior and mental health by gender in Korean adults before, during,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PLOS ONE, 2025)
- 통계청, 「가구 및 인구 동향」 (최신 연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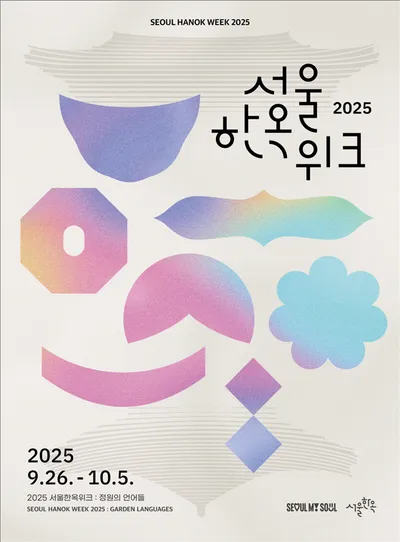
![[집중기획] 2026년 세계 산불 달력, 그을린 미래를 직시하다](https://cdn.breathjournal.com/w400/q80/article-images/2025-10-01/5be639f5-d684-4605-acb1-e0127c554e7c.png)





댓글 (0)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