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세 때 전남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고, 그 무렵 협률사 공연에서 명창 이화중선(李花中仙)의 「추월만정」을 듣고 소리꾼의 길을 결심했다.
15세에 당대의 대명창 송만갑 문하에 들어가 「심청가」와 「흥보가」를 배우며 본격적으로 판소리에 입문했다. 이후 정정렬에게 「춘향가」와 「수궁가」를, 박동실에게 「심청가」「흥보가」「수궁가」를 익히며 동편제와 서편제를 두루 섭렵했다.
광복 이후에도 정응민, 정권진, 박록주, 김여란, 박봉술 등 당대 명창들에게 배움을 이어가며 평생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으며, 깊은 울림과 절제된 창법으로 한국 판소리의 정신적 기둥으로 평가받는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예술 공연이 아니라, 시대와 공동체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울림의 장이었다.
Q1. 명창님께 판소리란 어떤 의미였습니까?
판소리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많은 이들은 판소리를 ‘예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예술 이전에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모여드는 그릇이었습니다.
웃을 때 부르는 소리가 있었고, 울 때 부르는 소리가 있었지요.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앞에 앉아 있는 이들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제 목소리 뒤에 늘 부모의 한숨, 아낙네의 고단함,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겹쳐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곧 사람들의 삶이었고, 저는 그 삶을 함께 부르려 했습니다.
Q2. 판소리를 하시면서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은 언제였나요?
전쟁이 끝난 직후, 초라한 극장에서 공연을 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관객들은 굶주리고 지쳐 있었고, 얼굴엔 웃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심청가」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모두 무표정했습니다. 그러나 “심청이 눈을 뜨는 대목”에 이르자, 객석 곳곳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 삶의 버팀목을 잃어가던 사람들이 함께 울고, 서로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한 자락 소리가 가슴을 열고 눈물을 끌어내며, 낯선 이들끼리 마음을 이어주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판소리는 개인의 기예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짊어진 시대의 눈물과 웃음을 노래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Q3. 제자들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리는 기교가 아니라 마음이다.”
물론 음정과 장단, 발성과 호흡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살아 있는 소리가 되지 않습니다. 노래하는 이의 가슴이 움직이지 않으면, 듣는 이의 가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스승에게 배울 때 가장 어려웠던 훈련은 목소리를 다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우고 채우는 법이었습니다. 삶을 깊이 겪은 사람이 내는 소리는 꾸미지 않아도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들에게 삶을 소리로 옮길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당부했습니다.
Q4. 판소리의 전승과 보존은 왜 중요한가요?
전통은 단순히 오래된 것을 붙잡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조상들의 한숨과 기쁨, 공동체가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온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판소리를 잊는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웃고 울었는지를 잊는 것입니다. 만약 그 기억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판소리를 지킨다는 것은 단지 음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다움과 공동체의 기억을 이어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Q5.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판소리는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젊은이들은 빠르고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공허함과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판소리를 들으면, 오래된 목소리 속에서 자기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웃다가 울고, 슬픔 속에서 다시 희망을 찾습니다. 그것이 판소리의 힘입니다.
판소리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삶은 기쁨과 슬픔이 얽힌 한 편의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함께 듣고 나누는 순간, 우리는 위로를 얻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Q6. 마지막으로 후대에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저는 평생 판소리를 했지만, 그것은 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노래였습니다. 소리는 사라지지만, 울림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세대를 넘어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 진심을 담아 소리를 이어간다면, 판소리는 천 년을 넘어 또 다른 세대를 울리고 웃길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소리는 우리의 숨결로 살아 있을 것입니다.
📌 편집자 주
이 글은 실제 대담이 아닌, 김소희 명창의 생애와 활동, 그리고 남겨진 기록과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한 가상 인터뷰입니다.
브레스저널은 전통을 단순한 과거가 아닌, 오늘의 삶과 이어지는 살아 있는 울림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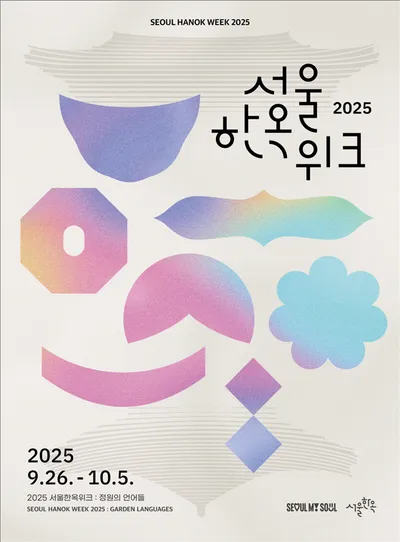
![[집중기획] 2026년 세계 산불 달력, 그을린 미래를 직시하다](https://cdn.breathjournal.com/w400/q80/article-images/2025-10-01/5be639f5-d684-4605-acb1-e0127c554e7c.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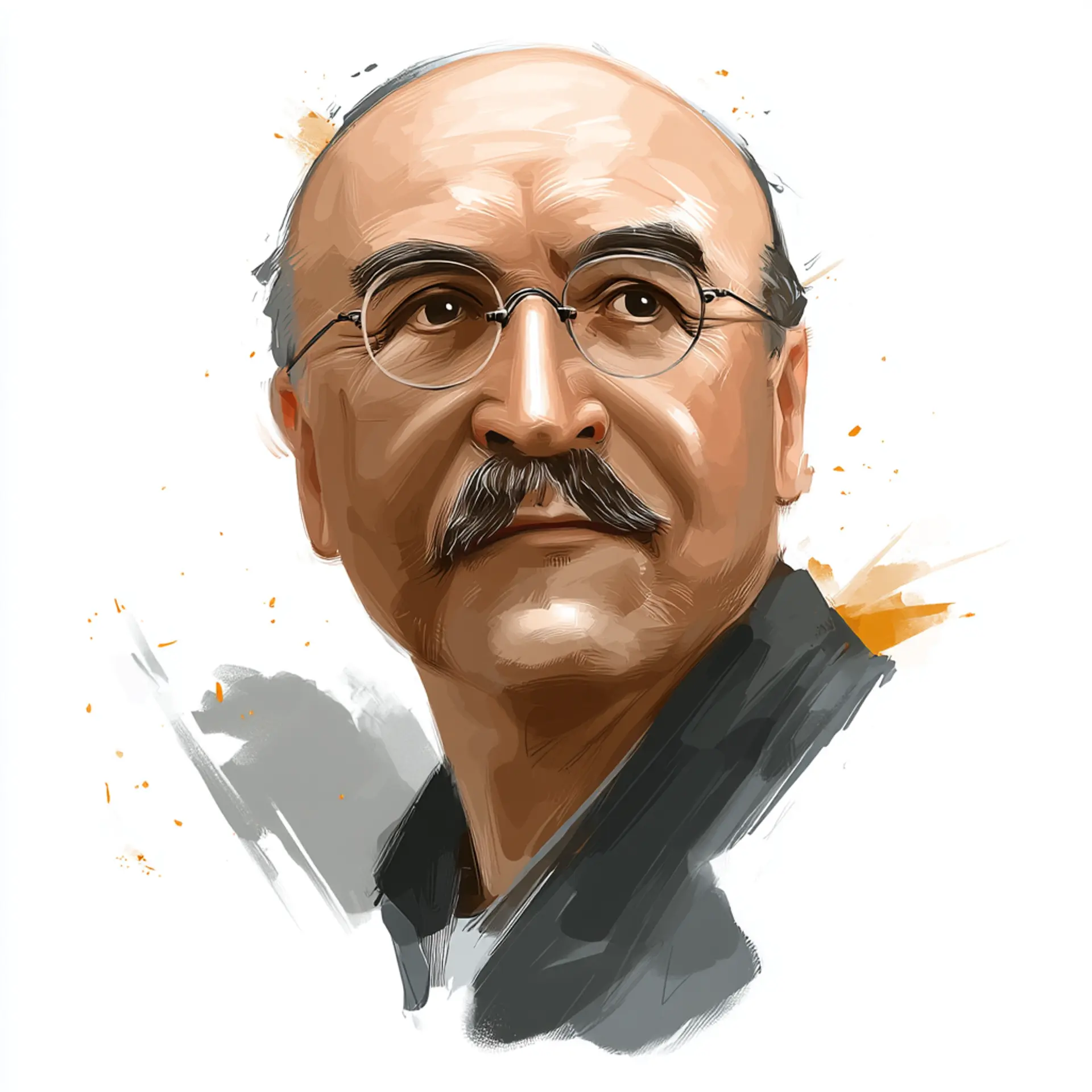

댓글 (0)
댓글 작성